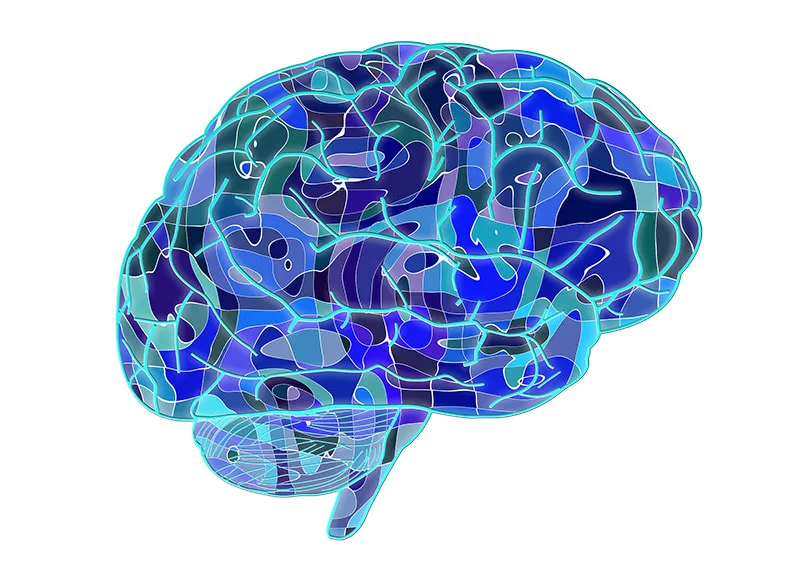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능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무리 발달한 현대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분자수준에서 이뤄지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일일이 스캔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지능을 탐구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어서 실험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진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일 거라는 생각은 거두는 것이 좋다. 개발자들은 그저 인간의 행동과 유사한, 혹은 지능적이라고 생각되는 퍼포먼스를 기계가 하도록 할 뿐이지, 그들이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과 닮은 기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급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진화의 과정에서 '지능은 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 만약 이에 대한 타당한 결론이 나온다면, 지능의 역할에 대한 통찰과 그것의 구현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발생원인을 알게 되면, 굳이 지능을 생물학적으로 모방할 필요는 없으로 구현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
지능은 왜 필요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짧은 글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논의의 출발점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진화evolution'라고 무언가를 개념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생존survival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세포가 탄생했던 43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화의 강을 건너 살아 남은(이 과정에는 난데없이 혜성이 날아들어 온 지구를 초토화시킨 난폭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건들이 포함된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 남은 단 한가지 이유는 단지 그들이 생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존에 뜻이 없는 생물들은 멸종했을 것이 틀림없지 않는가!
때문에 현상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할 때는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설명이 강박적으로 들러 붙을 수 밖에 없다. 사자가 힘이 센 것도, 기린이 목이 긴 것도, 사슴의 눈망울이 이쁜 것도, 임신부가 입덧을 하는 것도, 아기가 귀여운 것도, 코알라나 팬더가 인생의 대부분을 잠자는 데 쓰는 것도, 나무늘보가 느린 것도, 꽃이 눈이 있는 모든 생물을 끌어 당기는 것도, 스컹크가 코 달린 모든 생물을 쫓아낸 것도 모두 생존을 위해 개발된 고도의 테크닉인 것이다.
지능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게다가 그 모든 생존 테크닉 중에 최고의 아트웍artwork일 것임은 지구를 정복한 사피엔스sapiens의 오만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때문에 우리는 파스칼이나 라이프니츠에서 유래된 '계산기계'의 궁극적 도달점이 지능일 거라는 서양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지능은 이성이며, 주어진 것이며, 혹은 타고난 것이며, 이데아를 그리워 하는 영혼의 회상이며, 신의 선물이며, 송과체pineal gland의 발현일 것인가?
문명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임을 강하게 믿었다, 라는 것은 전적으로 서구과 서구화된 동양인의 생각일 뿐이다(전통적인 동양에서 인간은 금수와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언급이 맹자에도 나오고, 불교의 윤회는 인간들끼리만의 사이클이 아니다). 어쨌거나 그런 생각은 널리 퍼졌고,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서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명제가 진리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게 받아들여진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생각을 받아 들이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그 덕에 우리는 모든 생물과 지구 자원을 제 것인 양 소비하며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지능이 모두 신경세포임이 분명해진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지능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그것의 구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능이 신경세포에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신경세포를 발현하는 DNA를 가진, 그리고 실제로 신경세포가 발현된 생물들의 목록을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고, 그 모든 생물들은 일정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능에 대해 생각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능이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에서 그 지능의 힌트를 얻을 수 없지만, 지능이 인간의 모양새만큼이나 진화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서(심지어 날아다니는 모기에서조차도) 지능의 본질에 관한 참고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지능이 왜 필요했을까?
이 물음은, 따라서, '모기에게 지능이 왜 필요했을까?'의 문제와 등가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모기에게 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그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능은 생존을 위해 발달된 '전략기제'이지, 계산의 기능을 하거나, 논리적 추론을 하거나, 이데아를 꿈꾸거나, 순수 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아닌 것이다. 계산, 이성, 추론, 탐구, 생각과 같은 개념들은 전략적 인간이 전략적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의 패턴에 대해 내린 일종의 임시적 스냅샷이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나 뉴런 뭉치를 떠나 외따로 존재하는 절대불변의 추상적 실체가 아니다.
=======================================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구현이 나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능이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것은 전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은 '답이 없는 것은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 있다.
해야 할 이야기는 끝도 없다. 앞으로 조금씩 공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