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 끝나면 종종 마음을 앓는다. 이십 년째 음악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하다. 재즈클럽에서의 연주가 일상이라면 공연은 여행과도 같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진이며 동영상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듯이, 앞으로도 며칠간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연 영상을 다시 보게 되겠지.
혹시나하고 유튜브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각자 한두 개씩 이날의 공연 영상을 올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행이었다. 최소한 그 곡들의 연주만큼은 싫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사실 눈에 띄는 실수와 무대 위의 우리만 알 만한 작은 실수까지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공연이라 끝나고 나서도 후련하기만 하진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법 흐름이 괜찮은 공연이었다는 건 안다. 이때보다 연주가 안 풀렸던 날들이 많다. 그러나 더 잘 하고 싶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연주자야, 하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그저 음악이 더 잘 나왔으면, 같이 연주하는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만족하고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절반의 만족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아마도.
공연 영상을 모니터 할 때에는 음악을 듣고는 있지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다. 저기에서 왜 틀렸을까, 누구의 실수였을까가 제일 궁금하다. 내 책임일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내 소리가 듣기 싫어 견디기 쉽지 않다. 틀린 부분들이 객석에서 들었을 때 음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기를 바랄 뿐이다.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야 이 영상들을 다시 보며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을것이다. 일 년 정도 지난 뒤에 이 공연을 잊지 않고 다시 들어본다면 흠,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모멘트가 많았어, 하며 씩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젠 내일 죽는다고 해도 요절이 아닌 나이가 되었어, 하고 말하곤 한다. 물론 아무도 웃어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며 약간 당혹스러워 할 뿐이다. 이전에는 더 좋은 무대에서 더 유명한 사람들과 연주하게 되는 것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매 번의 연주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주 놀랍지는 않은 나이가 되었으니까, 하고 덧붙이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주곤 한다. 때로는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더 좋은 표현을 찾아내야 하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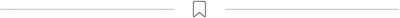
여성 뮤지션들의 음악을 두 명의 여성 뮤지션이 돌아보고 재해석하는 컨셉의 공연이었습니다. 조니 미첼, 시네이드 오코너, 니나 시몬, 아레싸 프랭클린, 패티 스미스, 칼라 블레이 등의 곡을 남메아리와 서수진, 두 젊은 재즈 아티스트가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둘의 자작곡들도 연주했구요. 널리 알려진 곡들이 아닌데다가 몇몇 곡들은 제법 과감하게 편곡을 해서 과연 관객들에게 음악이 잘 전달될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조금 의외다 싶을 정도로 객석에 음악이 가 닿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