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의 기계적 발행
대개의 암호화폐는 시간/연간 발행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난이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계적인 발행하에 인플레이션율 또한 사전설정된 구조로 계속 발행됩니다.
이는 법정화폐 경제권의 통화 정책, 빚으로 빚을 갚는다 + 정치적 논리로 찍어낸다가 금융위기 및 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을 초래했기에, 크립토씬에서는 그런거 말고 깔끔하게 원리대로 착착 찍어냅시다.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그 늘어나는 물량이(설령 어느시점 발행이 중단되더라도) 생태계 참여자와 암호화폐의 가치가 제대로 측정/반영되지 않은 채 너무 성실하게 물량만 잘찍어 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출처:pixabay
즉, 우리는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원리로 채굴이 일어나며, 생태계 원리상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지 않는 한은, 시간이 갈수록 성실하게 물량만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혹여 그 비전어린 멘트에 기대감이 더해져 시장가격 펌핑이라도 온 경우 + 하지만 생각만큼 가치증명이 안 될 경우, 가격하락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겪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빚 공학적 매커니즘을 배제한듯 하여도, 사전 계획된 대로 성실히 발행만 했기에, 빚으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의 법정화폐 이상으로 널뛰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가치의 빚을 암호화폐도 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
가치
가치는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그리고 키워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법정화폐를 대신해 생태계 참여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고유의 화폐를 공정히 발행해 나눠주며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확립이라 한다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명확한 것을 원합니다. 엑셀순환논리를 빼고, 담백하게,
생태계가 뭘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게 법정화폐로 치환한다면 어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심플해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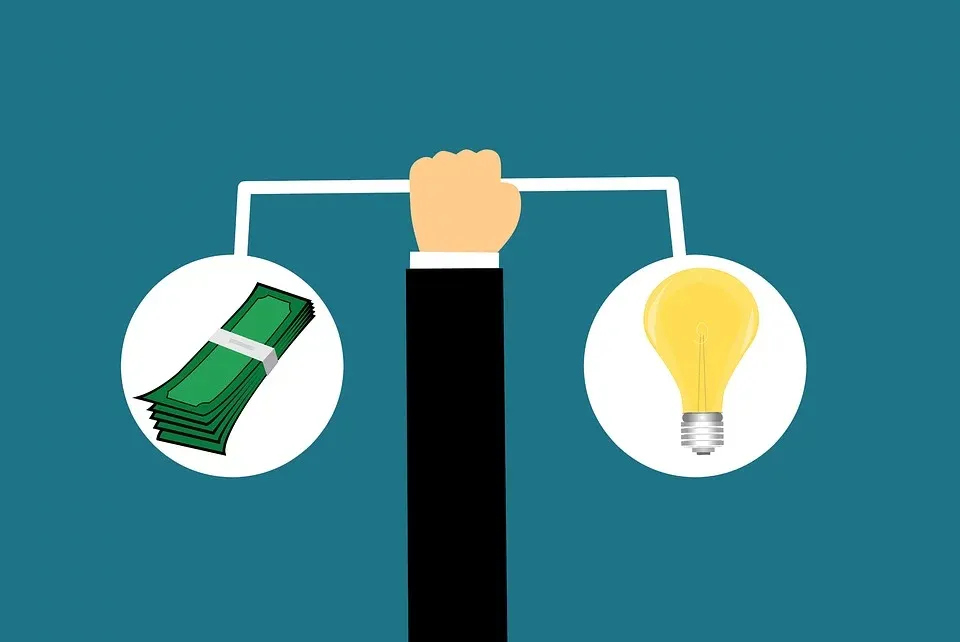
출처:pixabay
글쓰기형 채굴화폐 스팀은, 두가지,
(1) 표면적 플랫폼 글들이 법정화폐로 얼만큼의 치환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2) 실질적 스팀 블록이 다양한 가능성의 사업을 진행하기 좋은 원재료라면, 사업들이 스팀 위에 돌아갈 때, 얼만큼의 상대비용을 절감하고, 얼만큼의 절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1)에서 글들로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에, 가치 유입은 커녕 가치 측정과 연결의 실마리조차 미구축되었기에, 다운보팅과 POB 논란에서 하염없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2)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스팀, 빠르고, 저렴하며, 블록체인 특징을 살려보기 좋은 모델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스플린터랜즈(스팀몬스터)입니다.
몇몇 다른 게임들도 사업의 시도는 있으나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느낌에 상대경쟁력이 미미하여 우리 자식(스팀계댑)이지만 어디 내놓기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은 기업형 혹은 프로젝트형 레벨에서 진행되는 사안일 경우가 많으며, 일반 유저들은 그 댑을 보고 뒤늦게 참여할까말까를 결정합니다.
(1)번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 주고받고 그렇게 생긴건 불안하니 결국 법정화폐화 하고 아니면, 초기에 막대하게 채굴한 물량을 들고 있다가 직원월급준다고 팔고 떨어져도 또 찍어서 팔고 그런 와중입니다.
어디에 가치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있나요?
#가치와 발행의 연동
만일, (1) 글쓰기로 채굴하는 화폐 스팀/SCT가
정확하게 가치를 만들어 낸만큼만 발행이 된다면? 여기서 가치 측정의 논란이 있기에, 우선은 쉽게 법정화폐의 유입이라고 근사치로 치환하여 상상해 보았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글로 채굴하는 플랫폼이지만, 보통의 글들이 돈을 벌기 위해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
컨텐츠 질의 제고, 글의 외부홍보, 광고주의 영입, 독자 확보 마케팅 등을 통해 실제로 법정화폐가 유입될 경우에만(1:1 혹은 1:x의 비율로), 발행량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잉? 그럼 기존 법정화폐 사업이랑 같은거 아냐?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팀에서는 (2)의 특징으로 인해 사업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는 엔진토큰들의 운영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고유토큰을 기계적 무감각적 가치 비연동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플랫폼이라면 정말 생태계참여자들이 가치를, 돈을 벌어올 때, 그에 비례해서 발행량을 변동적으로 발행하는 구조는 어떨까요?

출처:piaxabay
당연히, 생태계 참여자들이 법정화폐를 들고와서 납입을 해도, 현금이 유입된 것이기에 일단은 일정비율로 발행을 합니다. 스팀으로 출자는.. 글쎄요 법정화폐나 스테이블코인 출자가 오히려 안정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글들이 하나의 광고라도 한명의 유료구독자라도 한명의 스폰서라도 만들어 낼 때, 추가발행을 합니다. 동시에 글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이모저모 시도해 보고 관련 수익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sct몬 고고씽?! ^^)
수익을 못내면? 다같이 추가발행없이, 그냥 원금은 거의 보전합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스팀과 엔진에서 버텨냅니다.
아울러 그렇게 만들어낸 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해야하는 이유로는
그 화폐로 우리 글들에 보팅을 하되, 향후 유입될 미래가치와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에 대한 소유권으로 평가시킨다면?!
즉, 먼저 팔수록 오히려 현재 수익만 받아갈수 있고, 미래 수익은 받아갈수 없게 되는 구조로 연동시킨다면..
초기에 스팀에서 글을 쓰고 보팅을 받고 그걸 매도해 너무 많은 수익이 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내글이 이정도 가치가 있다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발권업이라는 단어에 취하여, 너무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의 형태든 사업의 형태든, 암호든 비암호든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데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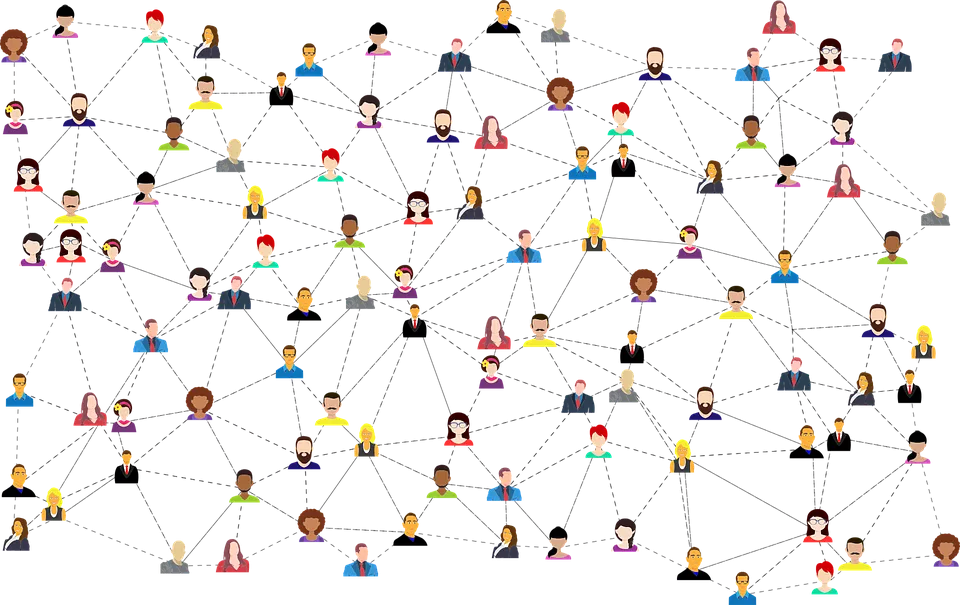
출처:pixabay
가치의 유입에 비례해 발행량이 결정되고, 보유량만큼 미래 가치유입의 소유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과다 발행의 논란도 동시에 유저가 늘수록 내 몫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진정한 가치창출을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 있지 않을까요?(비싸게 샀다고 물릴 염려도 없음)
치환의 형태로 가치를 안정화 담보화 하는 방법은 사실 KRWP가 스팀계에서는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①치환이 되는 대상이 자기자신의 화폐(sct)라는 점과, ②납입된 자본금이 또한 변동성이 충만한 스팀(steem)이라는 점, 그리고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③유저와 가치에 무관하게 계속 발행된다는 암호화폐 전반의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답 증인과 경영진/무분별한 다운보팅/개발의 부진함 등으로 골치아픈 스팀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신뢰가 더 갑니다.
가치와 발행의 탄력적인 연동이 가능할수 있을지 미흡한 상상을 오늘도 해보았네요..
모두들 편안한 밤되세요~^^